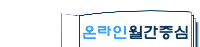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생활법문) 예불의 핵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19-12-17 19:41본문
<예불의 핵심>
예불은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식입니다. 예불의 핵심은 칠정례죠. 그리고 칠정례의 핵심은 지심귀명례. 이 다섯 글자입니다.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귀. 돌아가 명. 목숨 바쳐서. 예, 예를 표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를 표하면은 목숨을 걸고 예를 표하다고 하겠습니까? 지심귀명례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목숨을 걸고 예를 표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말기는 너무 서운하니까, 7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표하는 건 뭘까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깍듯하게 예를 표할 때는 보통 절을 하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죠. 우리도 예불을 할 때 큰 절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께 예를 갖출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낮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잘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표할 때는 상대방을 높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높이고 높이다 보면 신의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드는 거지요.
물과 불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존재,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절대자의 뜻에 따라서 절대자의 종으로 살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까지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는 절대적인 신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예를 표하려면 상대방을 신격화시키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신일까요?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수행자이십니다. 수행자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오버를 하는 거지요. 오버해서 부처님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격화시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출 때 상대방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불은 내 자신을 낮추는 의식입니다. 예불이 곧 하심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실상사에 놀러 간 적 있습니다. 실상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철불이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같이 갔던 친구가 아마 불자였던 거 같습니다. 나는 그 때까지 불교는 말할 것 없고 종교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고사하고 법당 안에 들어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법당을 들어가서 내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더니 나보고 삼배를 해라고 해요. “내가 왜 삼배를 해야 되냐? 그냥 조각상인데 너나 해라 나는 안 하련다.” 이렇게 철불 앞에서 둘이서 티격태격하다가 그 친구 혼자 하고 나는 기분이 상해서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존경하지도 않는데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지요.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무작정 머리를 숙인다는 게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불을 할 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절하는 동안은 부처님 제자로서 하심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심이 그렇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 출가하는 행자들은 사람대접을 못 받습니다. 요즘이야 출가자가 귀해서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걸을 때도 차수를 하고 다녀야 되고,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되고 항상 땅만 보고 걸어야 되고, 내가 먼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고, 누가 나한테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예, 아니오. 그리고 후원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 둘째 치고 보살님들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대접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다 보니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아 내가 참 별 볼일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설치고 다녔을까?’ 물론 행자 시절 잠깐이긴 했지만 그 때 진짜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그게 하심인지도 모르고 하심을 한 것이지요. 왜 그때 행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고, 조금만 못 하면 밤 9시가 넘어서 지장전에서 참회를 시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심을 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심 하라고 말로 해 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하심을 하도록 억지로 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심해야지’ 생각한다면 그건 머리로 하심 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하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심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절하는 동작 하나 하나 집중해서 부처님 전에 온 몸을 던지노라면 나도 모르게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반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심이 시작됩니다.
하심이 깊어지면 무심이 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보입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래 하(下)에 마음 심(心) 하심이 없을 무(無), 마음 심(心)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없어질까요? 바로 이 중생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생심은 뭡니까? 나는 잘났다는 생각이 중생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어디 있다고. 이 나이 되도록 이루어 놓은 것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사는 게 참 변변치 않고,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잘난 게 어디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내가 잘났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 명 모이면 하는 대화의 반이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 흉보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뒷담화 만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말을 해야 잘 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못났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잘났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예를 표하는 것은 곧 하심 하는 것이고 하심을 해서 낮추는 것은 우리들의 중생심입니다. 낮추고 낮추다 보면 중생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이 곧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글자가 남았습니다. 돌아갈 귀자. 어디로 돌아갈까요? 예불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 이 법당이 내 자신으로 꽉 차는 듯한 느낌. 내 앞에 부처님 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는 듯한 그런 기분.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부처입니다. 이것이 길어지고 길어지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어서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로서 행동하고 부처로서 절하고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중생심은 잠깐 잊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잊어버리면 부처가 되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잠깐입니다. 길어봐야 몇 초 정도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 부처인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심하고 하심해서 중생심을 털어버리기만 하면 부처님의 모습이 환히 드러나리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심만 잘 하면 불교 공부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행이 곧 하심이요, 하심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첨부파일
- 191122_중현스님.MP3 (10.0M) 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7 23:34: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