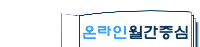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21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0-02-17 21:39본문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나온 “신통과 묘한 작용이여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것이다”는 방거사의 게송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방거사의 본명은 방온이며 당나라 시대 사람입니다. 본디 학식 높은 유생이자 부호였으나 참된 진리를 구하는데 뜻을 두어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물었습니다.
방거사가 석두스님을 찾아가 질문하기를,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하니 미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석두스님은 손으로 방거사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거사는 여기서 활연히 깨친 바가 있었습니다. 방거사는 인사를 올리고 수백리길을 걸어 마조 선사를 친견하러 갔습니다. 석두스님에게 물었던 것과 같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하고 여쭈니 마조 선사께서는 “네가 서강의 강물을 한 입으로 다 마셔 버리고 온다면 그 때에 그대를 향해 알려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끝에 방거사는 비로소 견성대오하고, 마조스님의 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뒤로 모든 재산을 동정호에 던져 버렸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이 옳지 않느냐고 하자,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을 어찌 남에게 주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울가에 초막을 짓고 산 죽을 베어 조리를 만들어 팔면서 생활하였는데, 부인과 딸도 참선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석두스님이 묻기를 “그대가 나를 만나 본 이후로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방거사가 말하기를 “날마다 하는 일을 물으시면 입을 열 곳이 없습니다.” 하고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지어 바쳤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 따로 없고
오직 나 자신과 만나 어울리네
어떤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지만
어디서도 틀리거나 어긋나지 않네
붉은색 자주색을 뉘라서 구별하리
산과 언덕에 티끌 하나 없는 걸
신통과 묘용이여
물 길어 오고 나무 해 올 뿐
방거사가 석두스님과 마조스님에게 한 질문에 등장하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사람이란 보조스님이 수심결 서두에서 인용한 단하 천연선사의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할 때의 그 한물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분별하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일으켜서 끌려다니는 그런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석두 스님은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표현해서 입을 막은 것입니다. 본래면목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조스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말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로지 스스로 분별을 끊어야만 밝혀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거사의 질문에 대해 석두스님과 마조스님은 본래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열대지방에 사는 원주민에게 아무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백번 천번 설명해 보아야 눈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눈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열대지방에서 지식으로 아무리 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도 한번 눈을 경험해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추운 지방에 데려가서 펑펑 내리는 눈을 직접 접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면목을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거사는 무슨 일을 하고 지내냐는 석두스님의 질문에 하는 일은 따로 없고 나 자신과 만나 어울린다고 게송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만나 어울리다’함은 곧 깨달음이 저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말하는 자신을 항상 놓치지 않고 자각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본래면목을 밝히는 길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분별심에 이끌려 마음이 밖으로 달려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리저리 궁리하는데 정신이 팔리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떤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지만, 어디서도 틀리거나 어긋나지 않네.’라고 하였습니다. 취사선택하려면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심을 내는 것은 깨달음과는 멀어지는 길입니다. 항상 회광 반조하여 분별심을 내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상생활에서 어긋나거나 틀리는 것 없이 매사가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티끌 하나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하여 옳다/그르다, 깨끗하다/더럽다 하는 분별심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미 그 자체로 스스로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에 티끌 하나 없다’는 것은 중생심으로 분별심을 내기 이전의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괜한 분별심을 내어 산세를 평하고 산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쓸모 있음과 없음을 따지다 보면, 어느 새 세상을 혼탁하여 만들 뿐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속에 비친 달처럼 실체가 없는 듯한데도 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심을 버리지 못한 중샘심으로 보면 신통처럼 보이고 묘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봄이 되면 언 땅에 싹이 돋아나고,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새 잎이 돋아나는 것만큼 신기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신이라도 있어서 꽃을 피우고 눈을 내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自然은 말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날고 천리 먼 곳의 일을 환히 보고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것이 신통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의 매 순간에 행하는 일들이 곧 신통이요 묘한 작용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혹한 중생의 행이 따로 있고 신통한 보살의 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본래 부처인 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곧 해탈의 장인 것입니다. 불법은 생활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걸어 다니고 서 있으며, 앉고 눕는 곳,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곳, 대화하며 모든 일을 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 속에 살고 있으며, 본래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바로 공적영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 공적영지한 마음이냐고 묻는 질문에 보조스님은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바로 그것이 그대의 공적영지한 마음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직지본심, 즉 본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거사가 ‘신통과 묘한 작용이여,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것이다’라고 한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 190614_중현스님.MP3 (10.1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1:39:41
관련링크
- https://youtu.be/UdLtsbFjWgY 284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