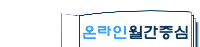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22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0-02-17 21:42본문
<해석>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 길을 가리키어 원천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대는 저 까마귀우는 소리와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 보아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거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이 도무지 없다고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허공과 같지 않은가?”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인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해설>
여기서는 반문문자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으로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육근 중에서 하나의 근이 본원으로 돌아가면 여섯 개의 근이 해탈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편벽되지 않고 두루 통하는 ‘원통’이며, 육근 중에서 소리를 듣는 이근을 닦는 수행이므로 이근원통이라 합니다. 이근원통 수행은 처음에는 소리에 집중하는 단계에서 다음에서 듣는 자성을 되돌리는 단계, 즉 반문문성의 수행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원오선사는 닭이 날개 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향엄선사는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에 견성했고, 서산대사는 대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오도했다는 것이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합니다. 실제 소리를 듣고 깨친 것이 아니라 듣는 성품 자체를 다시 되돌리는 반문문성의 단계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반문문성의 수행법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염불시수, 즉 ‘염불하는 것은 누구인가?’ 라는 화선참선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염불시수’ 화두를 어떻게 들 것인지, 허운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염불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면 제가 답하기를 ‘염불하는 것은 저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염불하는 것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입으로 염불합니까, 마음으로 염불합니까, 만약 입으로 염불한다면 당신이 잠들었을 때는 왜 염불하지 못하며, 만약 마음으로 염불한다면 당신이 죽었을 때는 왜 염불하지 못합니까.’ 합니다. 이 의심나는 곳을 계속 의심해야 됩니다. 이 염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미세하게 돌이켜 비추어 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성을 돌이켜 듣는다.’는 것입니다.
반문문자성은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두 번 사용 됩니다 첫 번째의 듣는다는 듣는 성품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의 듣는다는 것은 돌이켜서 들을 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도대체 이 의심하는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허운 스님 말씀처럼 의심이 가볍게 일어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이렇게 의심하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돌이켜 듣는 것’이며, 觀하는 것이며, 빛을 돌이켜 비추는 것, 즉 회광 반조하는 것입니다. 듣는 성품이 무엇인지 의심만 하는 것은 돌이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성품이 무엇인지 돌이켜 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의심만 하면 삼매에 들 수는 있겠지만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단지 하나의 생각에 마음을 집중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아지경일 정도로 놀이에 몰입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드라마에 빠져들어도 역시 깨달을 수 있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그 한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지 돌이켜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광, 반조, 반문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회광반조하고 반문할 때 비로소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스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혜스님은 서장에서, “예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갖춘 분들은 알음알이, 분별하는 마음을 번뇌로 여기지 않았으니, 그 까닭은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난 곳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분별심이 생겨난 곳을 인식한 이상 바로 이 분별심이 그대로 해탈의 장이며, 그대로 생사를 벗어난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추밀에게 보내는 답장1)
대혜스님도 한 생각이 생겨난 곳을 깨달아 알면 분별심이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지 않고, 분별심이 곧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대혜스님이 말하는 분별심이 생겨난 곳은 곧 보조스님이 수심결에서 강조하는 공적영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허운스님이 말씀하시는 화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생각과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과 말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일체의 분별도 없고, 일체의 분별이 없으므로 있다/없다는 분별도 없어서 없지도 않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므로 밝고 밝다고 한 것입니다.
보조스님은 공적영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지 묻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서 마음을 까마귀 소리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잡다한 생각과 망념을 모두 걷어내고 오로지 까마귀 소리를 듣는 데만 마음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로 들리는 한 소리에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무엇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지?’하는 의문이 가볍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느끼려고 해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의심이 계속 이어집니다. 의심이 떠나지 않으면 마음은 의심에 집중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밖으로 향하여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고, 혀를 통해 맛보는 작용이 멈추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의심하는 마음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한다.’, ‘안으로 돌이킨다.’는 표현은 항상 나의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듣는데 익숙한 사고에서 나온 습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대상, 혹은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마음의 행위 그 자체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듣는 것입니다. 만약 분별심을 분별심으로 헤아리게 되면 주체를 다시 또 객관화하고, 객관화하는 주체를 또 다시 객관화하는 악순환을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별심으로 따지지 않고 ‘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 190621_중현스님.MP3 (10.0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1:42:09
관련링크
- https://youtu.be/ThaatwEly64 302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