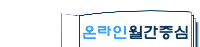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23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0-02-17 21:45본문
<해석>
이미 모양이 없으니 어디 크고 작은 것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으니 한계가 어디 있겠는가.
한계가 없으므로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도 없으며
멀고 가까움이 없기 때문에 저것과 이것도 없다.
저것과 이것이 없으므로 가고 옴도 없고,
가고 옴이 없으므로 나고 죽는 것도 없다.
나고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옛과 지금이 없고
옛과 지금이 없으므로 미혹하고 깨친 것도 없다.
미혹과 깨침이 없기 때문에 범부와 성인도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은즉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일체 모든 이름과 말을 붙일 수도 없다.
이미 다 없어서 모든 감관과 감관의 대상과 망령된 생각
내지는 갖가지 모양과 갖가지 이름과 말이 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어찌 본래부터 비고 고요하며,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모든 법이 비고 고요한 곳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는 어둡지 않아
생명이 없는 것과는 달라서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안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바탕 깨친 성품이다.
<해설>
공적영지한 마음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일체의 분별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일체의 분별이 없으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대적인 범주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즉 크고 작음, 안과 밖, 멀고 가까움, 이것과 저것, 가고 옴, 나고 죽음, 옛과 지금, 미혹과 깨침, 범인과 성인, 더럽고 깨끗함, 옳고 그름 같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대성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상인 객관과 ‘나’인 주관의 구별이 뚜렷한 이런 마음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이것이 모든 번뇌의 근원, 즉 ‘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별심은 상대적입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존재하고,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항상 선한 것도 없고 항상 악한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대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공한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도리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言語道斷 心行處滅,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분별심입니다. 空寂, 즉 텅 비어 고요한 것은 일체의 망념, 모든 분별심이 끊어진 것을 말하며, 靈知, 즉 신령스럽게 안다는 것은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역동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본체는 생각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텅 비어 공적하다고 억지로 지어 말하고, 분별심으로는 알 수 없기에 신령스럽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이 일어난 자리를 알면 분별심이 곧바로 지혜인 것이며, 생사의 장이 곧 해탈열반의 장인 것입니다.
텅 비었으면서도 신령스럽게 밝게 빛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깨달은 이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더라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볼 뿐 정작 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달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바라보려면 먼저 저것이 손가락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닌 무엇을 가리키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을 보려면 먼저 손가락이 손가락인 줄 알아야 합니다.
공적하다, 본래 마음이다 이런 말들은 결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이름 붙일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붙힐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할 도리가 없으니 신령스럽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마음은 춥고 더운 것을 느끼고, 배고픈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째서 이 마음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돌이나 강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 해도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라도 사람이 미리 프로그램하지 않으면 결코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말하고 걷고 춤추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우리들의 삶 그 자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달리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분별심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령스럽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는 사람은 꼼짝 않고 앉은 채 그대로 해탈할 것이며,
이것을 모르고 등지는 사람은 오랫동안 육도에 윤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마음에 미혹하여 육도에 떨어지는 사람은 가는 것이요 흔들리는 것이며, 법계를 깨달아 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오는 것이며 조용한 것이다.’라고 하셨다.
비록 미혹하고 깨친 것이 다르지만 근본에서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법이란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하셨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에 있어서도 더하지 않고
범부에 있어서도 덜하지 않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에 있어서도 더 빛나지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었어도 어둡지 않다.
이미 성인에 있어도 늘지 않고
범부에 있어도 줄지 않는다면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뿐이다.
<해설>
스님은 육도에 윤회하는 삶을 ‘가는 것, 흔들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마음에 미혹하면 그 마음을 등지게 됩니다. 등지게 되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남’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나’와 대상으로 나눠지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분별심이 이어지고, 마음에 드는 것은 욕심내고 들지 않는 것은 미워합니다. 이렇게 미혹한 마음으로 우리는 업을 짓고 그 결과 윤회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등지고 가는 것이며, 고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분별과 망상의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과도 같은 본래 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며 온갖 고통스런 번뇌망상을 털어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보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고 간다는 말에 현혹되어 실상을 놓칠까 우려하여 다시 근본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인과 범부가 다르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다르다면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190628_중현스님.MP3 (10.1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1:45:17
관련링크
- https://youtu.be/FL75iehWCC0 305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