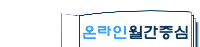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26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0-02-17 21:56본문
<해석>
비록 뒤에 닦는다 하지만 이미 망념이 본래 공하고 마음의 성품이 청정한 것을 먼저 깨쳤기 때문에 악을 끊어도 끊을 것이 없으며 선을 닦아도 닦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참다운 닦음이며 참다운 끊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온갖 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 기본을 삼는다.’ 하셨다. 규봉스님도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뜻을 총 정리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가 본래부터 스스로 다 갖추어 있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 깨치고 그 깨침에 의하여 닦으면 그것을 최상승선, 혹은 여래청정선이라고 부른다. 만약 생각 생각에 닦고 익히면 자연히 점차로 백 천 삼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문하에 전해 내려온 것이 바로 이러한 선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돈오와 점수의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해설>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망념이 사라져 마음이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망념이 사라지면 신령스러운 작용인 영지가 비로소 나타납니다.
규봉 종밀 스님은 선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불교 이외의 사람들이 닦는 외도선, 범부들의 체계화되지 못한 선인 범부선, 관법을 위주로 닦는 소승선, 대승의 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대승선, 그리고 가장 수승한 여래청정선 혹은 최상승선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앞의 네 가지는 모두 망념이 본래 비었고 청정한 자성이 본래 부처와 다름없다는 확신이 없이 닦는 것입니다. 오직 여래청정선만이 확실한 깨침 위에 닦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앞의 네 가지가 유념으로 닦는 것이라면 여래청정선은 무념으로 닦는 것입니다. 물론 규봉스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견도 없지 않습니다.
앞의 단락에서는 깨친 뒤에도 수행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깨친 뒤의 수행, 지혜로써 닦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념으로 닦는 것, 즉 무념선입니다. 보조스님은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착함을 닦아도 닦음이 없다고 무념선을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다는 것은 악을 끊되 끊는다는 생각이 없이 끊는 것이요, 착함을 닦아도 착함을 닦는다는 생각이 없이 닦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념으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다운 수행이라고 스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와 같습니다. 금강경 제4분 묘행무주분에 보면,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승불교의 수행법인 육바라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강경에서도 상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에 얽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컵이 있다고 합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쓱 봐도 이것이 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컵으로 물을 담아 마시거나, 커피를 타 마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컵이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이것의 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컵을 보고 참 예쁘다는 느낌을 받아서, 컵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런 탐내는 마음은 나쁜 생각이니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즉 탐심이라는 망념을 끊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탐욕은 나쁜 생각이니 버려야 한다는 생각, 즉 유념으로 수행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 지혜로써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상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끊는다는 생각, 닦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고 또 닦는 것이 유위의 일이라면 이런 생각이 빈 채로 끊고 닦는 것은 무위의 일입니다. 무위의 일이 바로 무념으로 하는 일입니다. 무념이란 마음속에 망상이 깨끗하게 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지 못할 것이 없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념으로 탐심을 끊고 무념으로 선행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서 닦는 것, 즉 최상의 수행, 진정한 수행은 탐심을 비추어 살펴보아 탐심의 정체를 알아차려서, 탐심의 실상이 텅 비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즉 망념이 본래 공함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탐심의 뿌리와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해석>
혹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성품이 빈 것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눌러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라고 하셨다.
<해설>
먼저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문은 성문승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의 사성제를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 자입니다. 성문승은 자신의 열반에 치중하여 깨달음의 지위가 아라한에 그치고 마는 수행자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문승과 비슷하게 연각승이 있습니다. 연각승은 고타마 싯달타 수행자가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깨달은 것처럼 홀로 12연기를 관찰하여 미혹을 끊고 깨달음을 얻은 자입니다. 연각승 역시 성문승처럼 자신의 열반에 치중하는 이들로써 아라한, 즉 아공의 이치만을 깨달은 성자일 뿐이라고 대승불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승불교가 부파불교를 자신의 열만에만 그치는 작은 수레 즉 소승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보살승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수행자로 자신과 남의 깨달음 즉 자리와 이타를 동시에 추구하는 수행자입니다. 부처는 아공과 법공을 모두 깨달은 성자이며, 보살승만이 진정한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화경 같은 대승경전에서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로 나누는 구분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이며 진실로는 오직 일불승 즉 깨달음에는 하나의 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적은 물건을 훔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음 밖의 도적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도적을 말합니다. 번뇌 망상은 공적영지의 마음을 가리고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 결과 중생들로 하여금 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도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 190719_중현스님.MP3 (15.0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1:56:31
관련링크
- https://youtu.be/Th2tnc8SdcM 264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