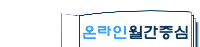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28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0-02-17 21:58본문
<해석>
만일 이와 같이 생각 생각에 닦고 익히며 비추어 돌아봄을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밝게 드러날 것이다. 죄업이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의 행은 스스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에 곧 나고 죽음도 끊게 될 것이다.
만약 미세한 번뇌의 흐름도 영원히 끊어져서 원만히 깨달은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감응하게 되니 그것은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응용이 무궁하고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여 오직 즐겁고 근심이 없으니 크게 깨친 세존이라 한다.
<해설>
용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번뇌는 고요하지 않은 마음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뇌의 어원을 살펴보면 ‘괴롭힌다. 물들인다, 더럽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번뇌는 잠재되어 있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을 뒤따르며(隨) 잠자고 있다(眠)는 의미에서 ‘수면隨眠’ 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대치하지 않는 한, 고요하지 않은 업이 몸과 마음에 쌓여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번뇌가 일어나면 악업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번뇌는 크게 보아 근본번뇌와 지말번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본번뇌는 탐, 진, 만, 무명, 견, 의로 6개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무명이 곧 번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한 그릇된 생각이나 성격을 모두 번뇌라고 합니다.
화신은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등 세 가지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불신관에서 다루는 것 입니다. 역사상 실존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에, 제자들은 부처님은 불멸의 영원한 진리 그 자체, 즉 법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곁에 왔던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들의 바람에 응하여 임시로 인간의 모습으로 몸을 변화시킨 화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부처님은 무한한 과거세로부터 보살로서의 수행을 쌓은 과보로 현세에 부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신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듯, 법신, 보신, 화신을 부처님의 세 가지 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깨친 후의 닦음을 하면 생기는 이득과 아울러 수행이 완성된 경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분별망상의 근본이 본래부터 없음을 알 때, 즉 눈병이 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허공의 꽃처럼 환상임을 알 때, 미혹한 마음에서 생겨난 것들도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 끊는 물에 녹는 얼음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렇게 망념의 뿌리를 환하게 비추어 보아 끊을 것도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 깨친 후의 닦음입니다.
망념이 생겨난 것은 중생들에게 과거부터 쌓아온 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써 닦아가다 보면 자연히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업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가벼워지고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고, 자비와 지혜가 밝게 드러나 공덕이 늘어나게 되어 자리이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가 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한 좋지 않은 업은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남을 위한 공간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행하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악업을 덜고 선업을 쌓아가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악업을 더는 것은 곧 선업이 쌓는 것이며 선업이 쌓이기 때문에 수행의 과정 자체가 곧 이타행이기도 합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행과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애초부터 한 몸이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 된 수행이라면 반드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불성을 먼저 밝히면 이타행은 저절로 따라오리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하는 닦음은 지혜로써 닦는 것이 아니며, 무위의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면 깨친 후의 닦음이 완성된 경지는 어떠할까요? 스님은 ‘미세한 번뇌의 흐름도 영원히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생들 마음 저 깊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뢰야식 가운데 쌓였던 습기까지도 모두 다 사라진 경지이며, 생사가 없는 마음의 본체에 완전히 계합하였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한 경지이며, 근본무명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지가 됩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분리시키던 거짓된 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에 나는 곧 모든 우주, 모든 생명과 일체가 됩니다. 이런 경지에서 나타나는 행동 하나하나는 곧 그대로가 자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행은 숱하게 많은 중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근기에 맞추어, 몸을 화하여 천 백억의 화신으로 우리 세계에 오셔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개의 강이 흘러도 하늘 높이 뜬 달은 그 강 하나하나에 제각각의 모습으로 비치는 듯 하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옹선사의 게송 중에 있는 구절입니다.
千江有水千江月 천개의 강에 물 흐르니 천 개의 달이 비치고
萬里無雲萬里天 만 리에 구름 한 점 없으니 만 리가 모두 푸른 하늘이로다.
천개의 강은 다양한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각각의 강에 달이 비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제각각인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에 응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는 불보살님의 자비행을 말합니다. 만 리나 되는 넓은 하늘에 구름 한점 없다는 것은 모든 분별심과 애착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구름 낀 하늘이 따로 있고 맑은 하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걷히면 그 자체가 바로 맑은 하늘이니 이것은 근본무명이 사라진 공적영지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깨침을 이룬 뒤에 어째서 점수를 해야 하는가라는 일곱번째 질문에 대한 스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을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중생들은 숱하게 오랜 세월동안 윤회하며 근본무명에 가려 삼독심을 쌓아 그것이 중생들의 성품이 된 바, 그 습기가 매우 깊어서 비록 이치를 단박에 깨닫는다 해도 깊이 뿌리박힌 습기는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로써 비추어 살피는 수행, 깨친 후에 행하는 수행이 필요하니 이는 삼독심이 일어날 때마다 비추어 살펴서 덜고 또 떨어서 쉬는 공부인 것이다. 그러나 망념으로 하는 수행은 마치 돌로 풀을 억지로 누르듯 망념을 의도적으로 없애려 하나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큰 망념일 뿐이다. 오직 상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하되, 망념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깨친 후의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망념으로 인한 악업은 덜어지고 선업의 공덕은 쌓이게 되니, 자리와 이타가 하나가 되어 모든 중생들의 근기와 요구에 부합하는 자비심을 행하게 된다.”
첨부파일
- 190802_중현스님.MP3 (15.1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1:58:38
관련링크
- https://youtu.be/8tZlunAHR4I 269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