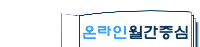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29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20-02-17 22:03본문
<해석>
깨친 후에 닦는 문에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시어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법과 그 뜻을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그 강요를 들면 단지 자기 성품의 본체와 작용, 이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공적과 영지가 그것이다.
선정은 본체며 지혜는 작용이다. 본체에 따르는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았고, 작용과 한 몸인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이 바로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선정이므로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조계 스님이 ‘마음에 산란 없음이 자기 성품의 선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기 성품의 지혜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다.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 고요함과 앎에 자유로워서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게 되면 그것은 돈문에 들어간 사람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먼저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린다 하여 선후로 대치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점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는 비록 성성한 것과 고요함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고요함만을 취하여 수행함을 면치 못하니 어찌 깨친 사람의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앎을 떠나지 않고 자유로이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조계 스님은 ‘스스로 깨쳐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를 따지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해설>
용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탈은 속박이나 결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해탈이라는 개념은 불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고대인도사상에서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당시 인도에서 널리 쓰이고 있던 해탈이라는 계념을 보다 폭넓게 계승하였습니다. 인도사상에서 해탈은 번뇌와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탈은 번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행복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경전에서는 해탈을 심해탈과 혜해탈 그리고 구혜탈로 나누고 있습니다. 심해탈은 마음의 풀려남을 의미하고 심해탈은 지혜를 통한 풀려남을 의미하고 구혜탈은 이 둘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해탈과 수행의 관계 특히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과의 관계를 보면, 사마타 수행을 함으로써 탐욕에 의해 오염된 마음을 벗어나 심해탈을 얻고,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무지에 의해 오염된 상태에서 벗어나 지혜를 개발하는 혜해탈을 얻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해탈과 혼용해서 쓰는 개념으로 열반이 있습니다. 해탈이 고대인도사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개념인 반면, 열반은 불교에만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반의 원래 의미는 ‘불어서 꺼진’ 또는 ‘불어서 없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즉 번뇌의 불꽃을 훅하고 불어서 꺼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사성제의 멸제를 의미하며 불교적 깨달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열반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깊은 삼매에 대한 갈애를 뜻하는 존재에 대한 갈애, 존재하지 않으려는 갈애 등 모든 갈애의 소멸이며, 삼독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갈애와 삼독을 불어서 끄는 것은 바로 팔정도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반과 해탈을 비교해보면 욕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심해탈만으로는 열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심해탈과 더불어 무명을 종식하는 혜해탈을 이루어야만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심해탈과 혜해탈을 모두 이룬 구해탈을 성취해야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열반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열반은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초기경전에서는 지금 여기 바로 내 눈 앞에서 드러내고 실현하고 구현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대승경전인 ‘열반경’에서는 영원하고, 행복하고, 궁극적 실재이고 깨끗한 것 즉 常樂我淨의 네 글자로 열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찍이 깨달은 분들의 죽음을 ‘빠리닙바나’라고 부르던 것을 중국에서 반열반으로 음역, 즉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였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반열반이라는 말 대신 익숙한 열반이라는 표현을 써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해탈을 오분법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분법신이란 부처님이 몸으로 삼는 다섯 가지, 즉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을 말합니다. 계율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율의 몸, 즉 계신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요한 선정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선정의 몸, 즉 정신입니다. 선정에 머물면 거울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관찰하게 되어, 연기법에 대해 밝게 이해하고 무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몸, 즉 혜신입니다. 마음이 탐진치와 같은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한 삶이 해탈의 몸, 즉 해탈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해탈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해탈지견신입니다. 여기서 계, 정, 혜 삼학을 닦아서 욕탐에서 벗어나는 해탈신은 심해탈을 의미하고, 해탈지견신은 혜해탈에 해당합니다. 오분법신은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이 계정혜 삼학을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겨서 온전히 닦으면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탈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열반은 삼독과 갈애의 불길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입니다. 해탈은 열반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독특한 개념인 열반을 주장하여 이미 통용되고 있던 해탈이라는 생각을 보다 깊고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體相用. 체는 본체, 상은 모양, 용은 작용을 의미합니다. 체상용은 동양철학에서 하나의 대상을 여러 틀로 분석해서 바라보고자 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예로 든다면 텔레비전의 몸체는 체, 겉모양과 성능은 상, 방송국에서 전파를 받아서 영상으로 바꾸는 기능은 용입니다. 유리병을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체는 유리, 상은 유리병의 생김도, 용은 물을 담으면 물병으로 쓰이고 술을 담으면 술잔으로 쓰이는 다양한 용도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을 분석할 때 마음의 체는 진여, 마음의 상은 여래장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번뇌의 먼지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용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과보를 받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 190809_중현스님.MP3 (9.9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2:03:09
관련링크
- https://youtu.be/vc6PeTvJ9s0 272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