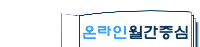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30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0-02-17 22:05본문
<해설>
용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선정은 사마디를 번역한 말입니다. 음역하면 삼매라고 합니다. 사마디는 마음이 산란되지 않고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첫째, 사마디는 자나의 결과, 즉 명상의 결과입니다. 팔리어 ‘자나’는 禪 혹은 명상으로 번역됩니다. 둘째, 사마디는 마음이 한 군데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한 곳에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듯, 마음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면 심리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사마디는 사띠, 즉 마음 챙김이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사띠는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밀착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장해서 의식적으로 사띠를 행하면 안 됩니다. 한마ㄷ로 사마띠는 마음이 이완되고, 침착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원문에 등장하는 ‘조계’는 중국 광동성에 있는 지명이며, 혜능 스님께서 이곳에 보림사라는 절을 짓고 선풍을 크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불가에서는 산중의 가장 높은 선지식을 칭할 때 존경의 뜻을 담아 스님의 법명이나 당호를 직접 호칭하지 않고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산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조계산에 주석하셨던 육조 혜능스님을 가리킵니다.
돈문은 시간과 순서를 거치지 않고 일시에 단번에 깨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차례를 밟아 깨치는 것이 점문입니다.
성성은 공적영지에서 영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작용으로 어둡지 않고 환하게 밝아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적한 것은 공적영지에서 공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요한 마음의 본체입니다.
이 질문은 여덟 번째 질문으로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보조스님의 사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조스님이 타락한 고려불교를 바로 잡기 위해 시작한 운동도 바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결사, 즉 정혜결사라고 한 것에서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은 계, 정, 혜 삼학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학의 내용을 알아보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닦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 정, 혜 이 세 가지는 불교의 수행 전부입니다. 먼저 계율을 지키는 것은 몸은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하고 싶은 말다하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고 싶은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수행과는 천리만리 멀어질 뿐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몸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지 않고 술을 마지지 않는 오계를 지키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의 기본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중생심에서 비롯되는 행동을 다스림으로써 중생심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중생심으로 행한 행동들은 몸에 배어서 쉽게 고쳐지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계를 지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중생심으로 익힌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행동이 계율에 어긋나지 않아서 몸이 안정되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선정을 닦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중생들의 마음은 마치 나무 위의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산란하기 짝이 없는 대상을 쫓아 온갓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리저지 쫓아다니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이 선정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즉 먼저 계율을 지켜서 몸을 다스려 안정시키고 다음에 마음 챙김 수행 등으로 삼매에 들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마침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먼저 더 이상 물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흙이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조심스럽게 깨끗한 물만 따로 걸러 내면 됩니다. 그래서 계의 그릇이 깨끗해야 선정의 물이 고이고, 선정의 물이 고여야 지혜의 달이 뜬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계정혜를 단계적으로 닦아 나가는 것을 상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수상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조단경”에서 육조 혜능 스님은 중생들의 마음에 계정혜 삼학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육조 혜능 스님께서는 “마음에 잘못 없음이 자성의 계며, 마음에 산란 없음이 자성의 선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지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어기는 행동들, 산란함, 어리석음은 우리들의 청정한 본래 마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성삼학이라고 합니다. 자성삼학은 본래 청정한 마음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조 스님은 자성삼학은 돈문이며 큰 근기의 사람이 공부하는 길이며, 수상상학은 점문이며 작은 근기의 사람이 하는 공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계정혜 삼학을 어떻게 닦아나갈 것인지를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정혜등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조스님은 선정은 자성의 체, 지혜는 자성의 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정과 지혜 모두 자성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것을 달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조 혜능 스님은 이것을 마음에 산란 없음이 자성의 선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점의 일렁임도 없이 고요한 상태인 선정이 따로 있고 모든 것을 환히 비추는 지혜로운 경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고요하면 마치 거울 같은 수면 위로 세상만물이 또렸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은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기에 지혜로운 마음은 마치 바람 한 점 없어서 도장을 찍은 듯 세상 만물 선명하게 비추는 수면처럼 고요합니다. 그러므로 선정과 지혜는 별개가 아니라 나의 본래 성품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일 뿐입니다. 보조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의 공적한 본체가 선정이요, 영지한 마음의 작용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성삼학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문으로 수행하는 것은 공적영지한 마음에 아직 눈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 190816_중현스님.MP3 (10.1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2:05:24
관련링크
- https://youtu.be/9Mm-gY-yMcU 271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