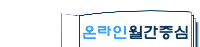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31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20-02-17 22:07본문
<해석>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뜻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며 원래 무위이어서 어떤 특별한 곳과 때도 또한 없다. 즉 대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러하고 옷 입고 밥 먹을 때에도 그러하며, 똥 누고 오줌 눌 때에도 그러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에도 그러하며 나아가서는 걸어가고 서있으며,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기뻐하고 성낼 때에도 언제든지 그러하다. 마치 빈 배가 물결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흐르는 물이 산을 끼고 돌 때에 형체에 따라 굽이돌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마다 알음알이가 없다. 그리하여 오늘도 무심하여 자유롭고 내일도 무심하여 자유로워서 가지가지 반연을 따라도 아무런 걸림이 없고 악을 끊거나 선을 닦지도 않는다. 또한 순박하고 솔직하여 거짓이 없어서 보고 들음에 무심하므로 한 티끌도 상대되는 것이 없으니 어찌 번뇌를 털어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한 생각의 정도 일어나지 않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해설>
용어 해설을 하겠습니다.
반연이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저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대상에 의지하고 일어남을 뜻합니다. 마치 칡넝쿨이 나무나 풀줄기가 없으면 감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반연이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모든 반연을 끊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얽힌 인연”으로 반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반연은 짖지 말라. 인은 어쩔 수 없으나 연은 물리칠 수 있다”는 말에서 ‘반연’은 ‘수행을 방해하는 얽히고설킨 복잡하고 쓸데없는 인연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돈문의 자성삼학, 즉 선정과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문의 선정과 지혜는 공적영지한 본래 마음을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순간이 평상심 그대로입니다. 이는 곧 돈오돈수, 즉 단박에 깨친 후에 더 닦을 것이 없는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조스님도 돈오돈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육조 혜능 스님은, “法無頓漸 人有利鈍 故名頓漸 법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사람의 근기는 날카롭고 둔함이 있다. 고로 돈과 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돈이냐 점이냐 하는 것은 사람들을 열반의 길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해석>
그러나 번뇌는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행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어 선악의 경계에서 마음이 동요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여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잊고 없애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육근이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음을 선정이라 하고, 마음과 대상이 함께 공하여 미혹함이 없음을 비추어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것이 비록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로써 점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지만 대치하는 문에서는 없을 수 없다. 만약 망상이 들끓거든 먼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을 거두어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 고요함에 계합하게 하며, 만약 혼침이 더욱 많으면 지혜로써 사물의 공을 관하여 미혹함이 없음을 비추어 보아 본래의 앎에 계합하도록 한다. 선정으로써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며 지혜로써 멍청함을 다스려 동요하거나 고요한 것도 끊어지고 대치하는 노력도 없어지면 경계에 대하여 생각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도 마음 마음이 도에 계합하여 걸림 없이 쌍으로 닦아야 일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하신 것과 같다.
<해설>
용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無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밥을 먹거나, 잠을 잔다거나 하는 행동처럼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행위, 선과 악으로 가려지기 이전의 행위, 선과 악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행위를 무기라고 합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보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는 유한하가 무한한가, 정신과 육체는 같은가 다른가 처럼 인간의 생각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침묵한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초기경전에는 이런 성격의 형이상학적 문제로 14개를 들고 있는데 이를 14무기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화두 참선 수행 중에 화두를 놓친 상태를 무기라고 합니다. 고요함에 매료되어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을 무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육근은 안, 이, 비, 설, 신, 의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우리 몸에 있는 눈, 귀, 코, 혀, 피부 같은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반야심경에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안이비설신의도 없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신체의 일부인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육근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합시다. 이 말은 도둑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도둑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제 밤, 집에 들어온 사람은 물건을 훔치기 전까지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가 물건을 훔쳐야 비로소 도둑이 됩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있을 때는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부르지만 죽어서 보지 못하면 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육근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인식활동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근을 다스려 조복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닦아 길들이지 못하면 미래세에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육근이 신체의 기관이라면 어떻게 조복하고 막고 지키고 닦아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육근은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항상 무엇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나의 밖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저기에 책상이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보고 듣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뭔가가 보고 듣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 밖에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고 듣는 행동만이 있을 뿐, 보는 놈, 보이는 대상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뿌리 깊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공 가운데는 안이비설신의가 없다고 한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공의 이치를 깨치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첨부파일
- 190823_중현스님.MP3 (10.0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2:07:44
관련링크
- https://youtu.be/cZQOzNTYiWg 172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