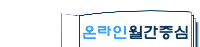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33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20-02-17 22:09본문
<해석>
스님께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깨친 후에 닦는 문에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며, 둘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자기 성품의 문은 고요함과 앎이 자재하여 원래 무위이어서 한 티끌도 대를 짓지 않으니 어찌 털어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 생각의 정도 일어나지 않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하고 판단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이 돈문에 들어간 사람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상을 따르는 문의 ‘이치에 따라 산란함을 거두며 사물의 공을 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서 무위에 들어간다.’ 하고 판단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이 점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해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선정과 지혜에 관하여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하는 수행이라면 먼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은 후에 다시 상을 따르는 문의 대치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상을 따르는 문에 의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린 후에 자기 성품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약 먼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한다면 고요함과 앎이 자재하여 다시 대치의 노력이 필요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마치 흰 옥에 무늬를 새겨 그 바탕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먼저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로서 대치하는 노력을 완성한 후에 자기 성품의 문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완연히 점문의 열등한 근기가 깨치기 이전에 점차 익히는 것이니 어찌 돈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노력 없는 노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만일 동시여서 전후가 없다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가 돈과 점이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아울러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즉 돈문의 사람들은 자기 성품의 문에 따라 걸림이 없고 자유로워 노력할 것이 없고, 점문의 열등한 근기는 상을 따르는 문에 나아가 대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문의 돈과 점이 다르고 우열이 분명하온데 어떻게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두 가지를 아울러 말씀하십니까? 다시 잘 설명하시어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해설>
아홉 번째 질문으로 수심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에서 자성정혜와 수상정혜를 설명했습니다. 보조스님은 선정을 자성의 체라 하고, 지혜를 자성의 용이라 하여 선정과 지혜는 공적영지심의 각각각 다른 측면일 뿐이라 하였고, 육조스님을 인용하여 마음에 산란 없음이 선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 없음이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성정혜입니다. 대상과 반연에 의지하는 수상정혜는 번뇌의 업장과 습기가 두터운 사람이 혼침이란 산란 같은 어느 한쪽에 마음이 치우칠 때 마음이 산란하면 선정으로 다스리고 마음이 혼침하면 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양극단으로 치우진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지 선과 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스님은 육조 스님의 ‘만약 선후를 따지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라는 육조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성정혜와 수상정혜 모두 선후를 따짐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아홉 번째 질문은, 앞서 나왔던 다른 질문들에 비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성정혜를 닦은 후에 수상정혜를 닦는가? 그렇다면 자성정혜만으로 충분한 터인데 굳이 수상정혜를 닦을 필요가 있을까? 둘째, 수상정혜를 먼저 닦고 자성정혜를 닦는가? 그렇다면 돈문의 수행은 깨친 후에 닦음이라 한 것과 어긋나지 않는가? 셋째, 이 둘을 동시에 닦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둘의 성격이 다른데 과연 가능한가?
아홉 번째 질문은 자성정혜와 수상정혜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시간적으로 선후의 관계인지 아니면 동시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근기에 따라서 자성정혜와 수상정혜 중 부합되는 것을 택하여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택일의 문제입니다. 우선 이 점을 명심하고 보조 스님의 대답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석>
내 해석은 분명한데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알려고 하면 의혹이 더욱 더 생기고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면 힐문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 두 문에 관하여 각기 수행할 것을 판단한다면,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돈문에서 노력 없는 노력으로 두 가지 고요함을 함께 활용하여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삶이다.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깨치기 전에 점문의 열등한 근기가 대치하는 노력으로 마음마다 미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는 사람이다. 이 두 문의 수행은 돈과 점이 각각 다르니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러나 깨친 뒤에 닦는 문에서 상을 따르는 문의 대치함을 아울러 논한 것은 점문의 열등한 근기가 닦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편으로 취하여 임시로 쓸 뿐인 것이다.
왜냐하면 돈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사람과 근기가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가지로 그 닦는 길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번뇌가 엷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선악에 무심하고 여덟 가지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으면 세 가지 느낌까지도 빈 사람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의지하여 자유롭게 겸해 닦으면 천진하여 조작이 없다.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이어서 자연의 진리를 이룰 것이니 어찌 상을 따르는 문의 대치하는 방법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먼저 돈오하였으나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경계를 대함에 망정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반연을 만남에 대를 짓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혼침과 산란에 떨어져 항상 고요하고 밝게 아는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은 곧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 대치함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해설>
용어 해설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삼수三受는 마음이 바깥 경계와 접할 때 생기는 세 가지 느낌으로 괴롭거나, 즐겁거나 혹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을 말합니다. 오온 중에서 수온이 곧 삼수입니다. 세친 스님은 즐겁다는 느낌, 즉 락수樂受는 대상이 사라질 때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 괴롭다는 느낌, 고수苦受는 대상이 생겨날 때 대상과 떨어지고 싶어하는 욕구로,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즉 불고불락수는 이 두가지 욕구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수에서 괴로운 느낌은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을 모두 포함합니다. 즐거운 느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수에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별도로 분리하면 낙수,고수,희수,우수,사수의 5수가 됩니다.
첨부파일
- 190906_중현스님.MP3 (10.0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2:09:29
관련링크
- https://youtu.be/NiD24ZJo3vc 130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