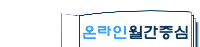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수심결 강의) 수심결 34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0-02-17 22:11본문
<해설>
용어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팔풍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덟 가지를 말합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이익과 늙어가고 기울며 나에게 손해가 가는 쇠락,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훼毁와 나를 기리고 받드는 예譽, 나를 칭찬하고 추켜세우는 칭稱과 나를 나무라고 꾸짖고 비난하는 기譏, 나를 괴로움에 멍들게 하는 고苦 와 나를 편하고 즐겁게 하는 락樂. 이 여덟 가지의 바람이 팔풍입니다. 팔풍은 나의 뜻을 거스르는 상황에 직면하는 역경계와 나의 뜻에 맞는 상황이 전개되는 순경계로 나누어집니다. 역경계를 당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래스가 쌓여서 화가 끊이질 않고, 우울하여 마음이 침통합니다. 역경계에 빠지면 빠질수록 고통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반면 순경계를 당하면 내 마음먹은 대로 일일 술술 잘 풀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탐욕심이 일어납니다.
역경계를 당하여 상황을 수용하고 인내하면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경계에서 빠져 나오기가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경허스님께서도 팔풍오욕의 일체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이 마음을 태산같이 써나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성정혜와 수상정혜간에 선후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조스님은 우선 자성정혜는 돈문의 깨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정혜는 점문의 열등한 근기에 있는 사람이 산란과 혼침이 있을 때, 이를 대치하는 노력으로 행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른 바탕 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즉 깨치기 이전인가 이후인가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깨친 이후의 닦음에서 말하는 수상정혜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조스님은 돈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기가 수승한 경우는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 이는 곧 더 닦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돈오돈수입니다. 반면 먼저 깨쳤으나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대상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서 혼침과 산란에 빠져서 공적영지한 마음의 성품이 흐려지는 사랑은 돈문에 들었으나 근기가 열등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점문의 수상정혜를 임시방편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돈문의 입장에서 점문의 선정과 지혜를 임시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번뇌의 습기를 털어내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성정혜와 수상정혜는 어느 것을 먼저 닦고 어느 것을 나중에 닦을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근기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혼동은 점문의 수상정혜와 돈문의 수상정혜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데서 오는 것입니다. 점문의 수상정혜는 깨치기 전에 애써 노력하여 혼침과 산란을 없애 마음이 반연에 끄달리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돈문의 수상정혜는 깨친 후에 남은 번뇌의 습기를 모두 털어내기 위해 점문의 수상정혜를 임시방편으로 빌려 쓸 뿐입니다. 보조스님은 돈문의 수상정혜에 대해서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 대치함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감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석>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서 잠깐 습기를 다스리지만 이미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는 본래 비었음을 깨쳤기 때문에 점문의 열등한 근기의 물들은 수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행이 깨치기 전에 있으면 비록 잊지 않고 노력하여 생각 생각에 익히고 닦지만 곳곳에 의심을 일으키어 자유롭지 못함이 마치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모습이 언제나 앞에 나타난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치하는 노력이 익으면 몸과 마음과 번뇌가 가볍고 편안한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가볍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눌러 놓은 것 같아서 오히려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깨치기 전의 닦음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다’고 한다.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는 비록 대치하는 방편이 있으나 생각 생각에 의심이 없어 물든 수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히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계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요하고 밝은 바탕을 활용함에 자유로워서 생각 생각에 일체의 모든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마음 마음에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는다. 그리하여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서 위없는 보리를 이루어 앞에 말한 근기가 수승한 사람과 아무 차별이 없게 된다.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가 비록 점문의 열등한 근기의 닦음이지만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 보면 쇠로 금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안다면 어찌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에 앞뒤의 차례가 있다고 두 가지 견해의 의심을 가질 것인가. 바라 건데 모든 도 닦는 사람은 이 말을 잘 연구하고 음미하여 다시는 의심하여 물러서지 않도록 하라.
<해설>
용어 해설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반연 攀緣, 마음이 저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칡넝쿨이 나무나 풀줄기가 없으면 감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듯,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대상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이 경우 칡넝쿨은 나무나 풀을 의지하듯, 마음은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을 반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연은 의지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나아가 불교에서 모든 인식은 반드시 대상에 의지하여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발전하여 반연에는 인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반연하는 작용을 능연能緣, 반연된 인식 대상을 소연所緣이라고 표현할 때의 반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반연을 짓지 말라는 표현에서 반연은 칡넝쿨처럼 얽히고설킨 인연을 말합니다.
이견, 즉 두 가지 견해는 단견과 상견을 말하며, 나아가 단견과 상견이라는 양극단에 집착하는 견해 즉 변집견을 말합니다. 단견은 이 세상과 자아는 사후에 완전히 소멸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인과와 업의 상속을 부정하며, 윤회와 열반을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반면 상견은 이 세상과 자아는 사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에서 말하는 자아인 아트만과 우주의 실재인 브라만이 있습니다. 불교는 아트만과 브라만을 오온에 근거하여 성립된 관념, 불교의 용어로 말하자면 假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점문의 수상정혜와 점문의 수상정혜를 방편으로 사용하는 돈문의 수상정혜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조스님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둘은 다르지 않기에 이 둘을 구분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 190913_중현스님.MP3 (9.9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22:11:20
관련링크
- https://youtu.be/pQPsU9v6jYc 156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