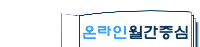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슬기로운 신행생활) 기도의 공덕과 가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1-05-16 12:54본문
가피력이란
사전적으로는 불보살님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힘을 말한다. 불보살님들의 자비심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합쳐져서 가피를 이룬다. 그런데 문제는 양무제나 나나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건강을 바랐고 양무제는 본인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바랐다.
무엇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가?
중생들이 보기에 우리에게 이롭다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들만큼만 가지고 있는 재물 같은 것이다. 우리들에게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좋은 것 내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우리 몸은 대가를 바란다. 중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라는 것에 집착한다. 때문에 나에게 이로운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반면 불보살님들이 보기에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열반에 이르고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즉 서로 무엇이 이로운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공덕
가피력은 불보살님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공덕이란 공을 들이는 것이다. 공은 힘써 노력하는 것이고 덕은 얻는다는 뜻이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은 공덕이 아니다. 굳이 공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노력을 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좋은 과보를 받았을 때, 그 때 우리는 공덕이라고 말한다.
공덕은 복덕이다.
공덕은 복덕과 같은 말이다.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복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부처님께서도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오랜 전생동안 숱하게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에 이루었다.
공덕은 불성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공덕이 없으면 불성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다.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아무리 가능성이 많아도 공덕을 쌓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고사한다. 공덕은 나를 위하는 중생심이 아니라 나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노력이어야 한다.
가문 끝에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가피라고 한다면, 공덕이란 농부가 땅을 열심히 일구는 것이다. 부지런한 농부가 비료도 주고 김도 메고 돌도 골라낸 밭에도 비가 내리고, 게을러서 손 하나 보지 않는 밭에도 비가 내리고, 돌무더기나 자갈밭에도 비가 내리고, 공장 폐수가 스며들어 아무 것도 자랄 수 없는 땅에도 비가 내린다. 그 중에 씨앗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은 부지런한 농부의 기름진 밭이다.
공덕없이 가피도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와 자비다.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의 비옥한 대지는 바로 공덕이다. 그런데 공덕을 쌓지 않은 농부의 밭에는 아무리 불성이라는 씨앗을 심은들, 그리고 비가 온대도 씨앗을 틔울 수가 없다. 이처럼 공덕은 불성이 자랄 수 있는 밭이다. 불성이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를 만나면 싹이 트고 자라서 영원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 열반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염원하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공덕이 없이 가피만을 바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성의 씨앗을 스스로 죽이는 짓이다.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공덕을 쌓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야 한다.
재물없이도 복을 쌓는 법, 무재칠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기운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공덕을 지을 수 있겠나?’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 잡보장경에 보면 어느 날 한 늙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당신이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다.
늙은이가 다시 말했다. “부처님이 보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을 돕고 싶어도 베풀고 싶어도 베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그렇지 않다. 아무런 재산이 없더라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무재칠시다.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화안시, 환하고 정다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2. 언시, 칭찬하는 말, 사랑스러운 말, 격려의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
3.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4.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눈으로 베푸는 것
5. 신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몸으로 때우는 것
6. 좌시, 그마저도 못하면 자리를 내주어서 양보하는 것
7.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행한다면 행복이 따를 것이라고 늙은이에게 이야기했다. 부처님께서 강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