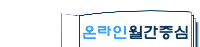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19-04-25 15:53본문
현재 증심사 금당에 봉안되어 있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초에 전남도청 뒤편에 있던 대황사지大皇寺址에서 지금의 증심사로 옮겨 온 것이다. 대황사지에는 철조비로자나불상 외에도 석탑부재와 석등, 범자문 7층석탑, 석조보살입상 등이 있었는데, 석탑부재와 석등은 현재 도청의 뒷마당에 옮겨져 있고 범자문 7층석탑과 석조보살입상, 비로자나불좌상은 증심사에 봉안되어 있다. 증심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무등산에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지만, 고려 명종대의 문인 김극기金克己가 지은시가 전하고 있어 오랫동안 법등이 이어져온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머리에 육계가 우뚝하고 나발의 크기는 일정하며 얼굴은 갸름하고 이목구비의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다. 목에는 삼도가 새겨져 있고 몸에는 가사를 두 벌 겹쳐 입은 착의형식으로 왼쪽 어깨위에는 밖으로 접힌 가사의 주름이 3개 새겨져 있다. 겨드랑이에는 역 U자형으로 깊이 패여 있으며 팔을 덮은 가사주름은 일정한 띠주름을 이루고 배와 결가부좌한 다리부분에도 띠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다.
전체적인 신체 비례면에서 볼 때, 신라하대 9세기말에 유행했던 두부가 작고 허리가 긴 장신형長身形 불상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새롭고 세련된 불상양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양 손으로 지권인智拳印의 수인手印을 결하고 있다. 지권인은 법신法身비로자나불 특유의 수인手印으로서 일반적으로 왼손 검지의 첫마디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는 수인인데, 이 불상에서는 좌우가 바뀐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지권인을 결한 좌우 손의 위치가 바뀐 예는 불국사 비로전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해서 신라하대의 몇몇 불상에서도 보인다.
증심사 비로자나불상은 신라하대 9세기부터 서남해안 지역에서 불상의 재료로 유행하였던 쇠[鐵]를 재료로 하는 분할주조법(piece mold)으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외형틀을 나누었다가 이은 분할선이 이 불상의 앞면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게 감춰져 있어 분할주조법으로 주조된 다른 철불상들에 비해 섬세한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나말여초기 이 지역 조각장인의 뛰어난 솜씨를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보물-불교조각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