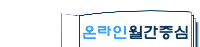2. 절 이름에 얽힌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1,658회 작성일 19-03-11 01:08본문
절 이름에 얽힌 이야기
어찌하여 그런 이름 가졌느뇨?
매화꽃 꽃망울이 한껏 부풀었다. 꽃봉오리 사이사이 날 선 긴장감이 팽팽하다. 한 줄기 다순 햇살만 얹어지면 이내 아우성치듯 환호성으로 가득할 것 같은
매화 한 그루. 한겨울 매운바람을 뚫고 꽃을 피워내 그 향기 더욱 고혹적인 매화. 가만가만 숨죽이며 들여다본다.
어쩌면 매화는 지금이 절정인지도 모르겠다. 봉오리 터뜨리기 전, 알싸한 향내 퍼뜨리기 전, 숨죽인 이 적요의 시간이 최고의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삶도 사람도 그러하지 않던가. 결과를 얻기 직전,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내달리는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찬연하게 빛이 나는 때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증심사가 에너지와 생동감으로 가장 생기 있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때일까?
불사가 한창이어서 날마다 경내의 모습이 새롭게 탈바꿈할 때일까? 아니면 창건의 첫 삽을 떴을 때일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자리에 절을 짓기로 결정하고 터를 닦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지을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절을 지을 것인지,
어떤 부처님을 모실 것인지,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한껏 설레고 부풀어 있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때는 적절한 긴장감과 기대나 희망 따위가 공존하는 시기로 꽃망울 부푼 매화꽃처럼 풋풋하고 싱그럽던 때이다.
하나 _ 마음을 증득하다 ‘증심사’
대부분 절은 그 절이 지어진 내력, 즉 창건설화가 있게 마련이다. 사람의 일과는 다른 데가 있어 신비롭고 환상적인 스토리일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종교적인 공간이다 보니 그리 윤색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증심사에는 그럴듯한 창건설화가 없다. 여기저기 자료를 들춰봐도 창건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좀 싱거운 감이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꾸며진 창건설화가 주는 이질감이 없어 도리어 좋다.
까닭 없이 붙여지는 이름은 없는 법이다. ‘마음을 증득하다’는 뜻을 가진 증심사證心寺. 왜 ‘증심사’라 이름 지었을까?
그 연유 또한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조선 시대 때인 1500년대의 책들에 ‘증심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가 1800년대 이후에 ‘징심사澄心寺’라는 기록이 보인다는 것이다.
1574년에 고경명이 쓴 「유서석록遊瑞石錄」을 보면 “.... 얼마 후에 증심사 주지 조선스님이 나와서 .... 조선 스님 말을 듣고 비로소 누교에 있는 시냇가 바위에 최송암이 쓴 시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알았으나 새긴 획이 옅고 이끼가 끼어 나로서는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애석한 일이었다. 절 옆에 있는 대밭은 산에 이어졌으니 규모가 커 위천의 그 넓은 죽림에 비길만 하다..... 조선스님이 법당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건물이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 초에 유명한 목수가 지었다는데 천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기둥과 주춧돌이 기울지 않고 의젓하게 홀로 남아 있으며 좌우에 있는 요사는 몇 번 개축했는지 모른다…….’
옛날에는 이 절에 대장경 판본과 여러 가지 불경이 든 상자가 한 전각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전각만 남고 경전은 없어졌다.
누대 앞에 오래 묵은 잣나무가 두 그루 있는 것이 보기에 한가롭고 좋았다. 이것이 비록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지 않으나 취백루라는 이름에는 손색이 없다.”
당시 증심사 풍광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귀한 기록이기도 하거니와 분명하게 절 이름을 증심사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 _ 마음을 맑히다 ‘징심사’
1926년 최남선의 「심춘순례尋春巡禮」에 나오는 증심사 이야기도 흥미롭다. “증심證心은 본디 징심澄心이라 하여 예로부터 저명한 절이요, 시방은 선암사의 유력한 일말사로 춘광 박군이 주지되는 터인데 .... 증심문으로 취백루로 하여 대웅전을 마주보면 회승당과 설선당의 두 당우가 좌우에 벌여 있고, 오백나한전이 그 뒤에 있어…….”라고 적고 있다. 증심이기는 하나 원래 이름이 징심이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856년 약사전을 다시 짓고 남긴 기록과 1925년 「광주읍지」에는 분명하게 ‘징심사’로 기록되어 있다. 절에서 불사를 하면서 남긴 기록에 징심사로 적혀있다는 것은 당시 절 이름이 징심사였다는 반증인 셈이다. ‘마음을 증득하라’는 뜻의 증심사가 ‘마음을 맑히라’는 뜻의 징심사가 된 연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마음을 증득하는 것이나, 마음을 맑히는 것이나 둘 다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수순이니 서로 닮은꼴 이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족 하나 _ 불로부터 절을 지키다
앞서 언급한 두 책은 정유재란(1597년)과 한국전쟁(1950년)을 20여 년 남겨두고 쓰인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건은 우리 역사상 큰 격변의 시기이기도 했거니와 증심사 입장에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두 번의 전쟁 기간에 증심사는 사찰 대부분이 불에 타버리는 화마를 입은 것이다.
증심사 입장에서도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고 간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을 터이다. 순천 선암사에 불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건물 벽에 ‘바다 海’자를 써넣었더니 그 뒤부터 불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와 마찬가지 이유로 증심사의 경우도 첫 글자 ‘증’ 의 부수인 ‘말씀 言’을 ‘물 水’로 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정유재란 때의 화재는 물의 기운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름에 물이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증’과 ‘징’은 어감도 비슷하니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방법이었을 것이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마음을 증득하다, 마음을 맑히다 라는 원래 뜻대로 모두 그러하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증심사가 더 이상 화마의 상처를 입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박선홍 님의 [무등산]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