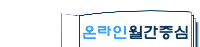4. 시대를 달리하는 증심사 3층, 5층, 7층석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증심사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19-05-14 02:43본문
석탑 3기
시대를 달리하는 증심사 3층, 5층, 7층석탑
역사는 진보한다고 했던가.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화도 꼭 그렇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다. 고도의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의 문화와 문화재가 역사속의 그것들보다 격이 높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리산 연곡사의 동부도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서 느꼈던 숨이 멎을 것 같던 전율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평생 그들의 포로가 되어도 좋다는 만용을 갖게 했었다. 하지만 현대 예술 작품 앞에서 아무리 코를 큼큼거리고 맡으려 해도 그때의 향취가 느껴지지 않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문화는 결국 한 땀 한 땀 마음이 수를 놓아가는 과정에서 만나지는 정수라는 생각이 든다.
증심사 경내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석탑 3기가 모셔져 있다. 특이한 점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석탑으로서 예술성은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불교가 당시 시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의 반영일 것이다.
불교가 지배 계급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삶에 깊게 뿌리내렸던 통일신라의 경우 석탑 1기를 세우는데도 물신양면의 협조가 있었을 터이니 정성을 쏟아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석탑과 같은 조형물에서도 그 영향은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창건의 역사와 함께한 3층석탑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철감선사가 증심사를 창건한 시점(855년과 868년 사이)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3층 석탑이 통일신라 말의 전형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땅과 맞닿은 기단부가 2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으로 탑을 쌓아올린 형태가 그것을 말해준다. 높이가 3.41미터인 이 탑은 퍽 안정감이 있다. 탑의 주요 구성 요소인 탑신부 부분이 안정감을 주는 배율로 줄어든 때문이다.
거기에 지붕모양인 지붕돌의 네 귀퉁이를 하늘을 향하도록 추켜올려 경쾌함까지 전해준다. 화려한 장식이 없는 대신 정제된 우아한 맛까지 살아있는 탑이다. 1971년 해체 복원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복장유물을 잃어버린 비운의 5층석탑
5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탑은 탑으로서 가치보다 이곳에서 나온 보물들 때문에 유명해졌다. 1933년 해체 수리를 하던 중에 탑 안에서 5층 철탑(19센티미터), 작은 철 부처 2구, 수정 1개, 염주로 추정되는 청옥 23개, 그리고 금동불 2구가 나온 것이다.
그중에서도 금동불 2구는 국보로 지정될 만큼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은 유물이었다. 이 중 부처님이 서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석가여래입상’은 크기가 15.9센티미터로 작은 불상이었는데 ‘중생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고,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손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1구의 불상은 ‘보살입상’으로 크기가 18.2센티미터로 금동불이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쓴 보관이며 두르고 있는 옷의 결 따위가 섬세하고 정교하게 살아 있었다. 그런데 이 2구의 불상은 통일신라의 유물이었다. 고려시대 석탑에 그보다 더 앞선 시대의 유물이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고려후기에 석탑을 새로 조성하면서 이미 있는 유물을 안치했을 것이다. 이 2기의 불상은 발견 이후 대웅전 유리상자에 모셔 일반인이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1948년 여순사건 등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무등산 일대에 빨치산이 자주 나타나자 광주경찰서에 맡겨 보관하게 되었다. 이구열 선생의 ‘문화재비화’ 책에 의하면 6.25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국립박물관에서 ‘국보특별전’을 마친 관장 일행이 광주에 들렀다 이 유물들을 보려고 증심사를 찾았다 한다. 광주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금고에 보관 중인 이 불상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6.25한국전쟁이 터지고 국보였던 이 유물은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말았다. 전쟁 중이라 신경쓰지 못해 잃어버렸다는 서장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국보 2점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 탑에서 발견되었던 나머지 유물들도 그때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만약 누군가 보관하고 있다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소박한 조선의 탑, 7층석탑
구조와 형태로 보아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탑신 부분에 연꽃과 산스크리트어를 새겨 넣은 단순하고 소박한 양식의 탑이다. 증심사에는 이처럼 창건 시기의 것부터 고려, 조선의 탑이 공존하고 있다. 서로 닮은 듯 각자의 색깔을 발산하면서 말이다. 1200년 역사를 살아온 고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멋이 아닐까 싶다.
궁금해요 1. 탑은 왜 만들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시신은 인도 장례법에 따라 화장을 했고 유골은 8부족에게 나누어져 각각 탑을 세웠다. 이것을 근본팔탑이라고 하는데 유골을 분배받지 못한 부족은 유골을 담았던 병을 가져가 탑을 세웠고, 재를 가져가 탑을 세운 부족도 있었다. 이것이 불교 최초의 탑이다.
그 뒤 인도의 아쇼카왕(기원전 268년에 즉위)이 근본팔탑의 유골을 꺼내 인도 곳곳에 팔만사천 개의 탑을 세웠다. 하지만 탑을 세우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만으로는 탑을 세울 수 없게 되자 경전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이나 불상 같은 것을 넣어 탑을 세우게 된 것이다
증심사 5층석탑 안에 유물이 들어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궁금해요 2. 증심사에는 왜 3층, 5층, 7층처럼 홀수 층의 탑만 있나요?
한 마디로 말하면 음양의 조화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다. 탑의 층수를 3, 5, 7, 9, 11, 13처럼 양에 해당하는 홀수로 세우고, 탑 모양은 음에 해당하는 4각, 6각, 8각 등의 짝수로 만들어 탑 안에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 연유로 증심사에도 홀수 층의 탑들이 있다. 하지만 경천사지 10층석탑 처럼 짝수 층의 탑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박선홍의 [무등산]과 곽철환의 [불교 길라잡이] 참고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